사이트맵
CEO·임원교육
임직원교육
단기실무·자격증
포럼·세미나
온라인교육
기업 맞춤형 교육
해외연수·정부지원
CEO 지식여행
이달의 조찬경연
회사소개
IMI 회원서비스 안내

- CEO·임원교육
- [한경협 최고경영자과정]
- [법률] 기업경영 법률리스크 최고위과정
- 한경협 임원리더십스쿨(신임 임원과정)
- 한경협 차세대 CEO 아카데미 (2세 경영자 및 젊은 창업자)
- 안보 · 방위산업 최고위과정
- [역사 조찬] 한경협 역사 최고위 과정
- 한경협 신사업 성장전략 최고위과정
- 임직원교육
- 한경협 리더스 아카데미 [부동산/금융/자산관리]
- [전략] K-인사이트 아카데미
- 기업 AI·AX 전환 컨설턴트 과정
- [AI] 업무에 바로 적용하는 한경협 생성형 AI 직무 활용 아카데미
- [인사노무] 인사노무 핵심전략 아카데미
- [MBA] 한경협 IMI MBA 과정
- 한경협 경영권 방어 아카데미
- 단기실무·자격증
- [재무] 기업재무 핵심전략 아카데미
- [전략기획] 전략기획 핵심실무 아카데미
- [영업] B2B 영업역량 향상 아카데미
- [전직원 ESG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]
- [조직문화] 데이터 드리븐 조직문화 전문가 과정
- [한경협 ESG 전문가 자격증]
- [ESG]ESG금융경제전문가 자격증
- 포럼·세미나
- 한경협 경영자 조찬경연
- 한경협 경영자 제주하계포럼
- 2025 한경협 HR 포럼
- [노사] 2026년 노사관계 핵심 이슈와 기업 대응 전략 세미나
- [AI 보안] 진화하는 사이버 위협과 기업 보안 리스크 관리 세미나
- 한경협 NEXT 리더스 포럼
- 한경협 마케팅 엑스포
- 온라인교육
- (심화)바이럴 퍼포먼스 마케팅
- (온라인) 2025년 한경협IMI 팀장 리더십
- (온라인)온라인마케팅 전략
- (온라인)비즈니스 엑셀+파워포인트 통합 실무 과정
-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
- 기업 맞춤형 교육
- (신임/선임) 팀장리더십교육
- 기업맞춤형 신입사원교육
- 사내강사 양성과정
- 한경협IMI HR컨설팅
- 사내 맞춤형 MBA Program
- [사내 맞춤형] 임직원을 위한 매월 찾아오는 프리미엄 강좌 시리즈
- 맞춤형교육 안내
- 최근 교육현황
- 주요 참여기업
- 해외연수·정부지원
- 우리가게&제품 홍보하기 AI 과정 with 뤼튼
- 한경협 CES 글로벌사업단
- 한경협 MWC 기업연수단
- 한경협 하노버메세 글로벌사업단
- 한경협 싱가포르 보안박람회(Black Hat Asia) 기업 연수단
- 한경협 호주 선진 노사문화 해외연수
- [구인수요 조사] 2026년 청년일자리 연계사업 참여기업 구인수요 조사
로그인
IMI국제경영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
로그인을 하시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
- 아이디 혹은 비밀번호를 잊으셨나요?아이디 비밀번호찾기
- IMI국제경영원 회원이 아니신가요?회원가입

- 커뮤니티
- 공지사항
FAMILY SITE
- 한국경제인협회
- 한국경제연구원
- 중소기업협력센터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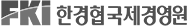
- Tel: 02-3771-0411
- Fax: 02-3771-0141
- E-mail: master@imilec.or.kr
- 주소: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타워 3층
- 법인명: (사)국제경영원
- 대표자: 김창범
- 사업자등록번호: 116-82-14479
- 통신판매번호: 2005-02764
- 관광사업(국제회의기획업): 제2017-000002호
- 평생교육시설(지식ㆍ인력개발사업): 제715호
- 원격평생교육시설: 제846호
- 국내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: 제2018-3180197-14-5-00032호
- 국외무료직업소개사업 등록번호: F1204020180002
COPYRIGHT(C) 2017 IMI국제경영원 ALL RIGHTS RESERVED





